[삶, 오디세이] 지구의 방생
법장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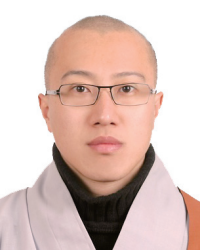
불교에 ‘방생(放生)’이라는 의식이 있다. 인간에 의해 잡힌 동물을 다시 그들이 살던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생명 존중과 공생이라는 불교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의식이다.
사찰에서는 봄, 가을이나 물고기의 산란기에 맞춰 방생의 법회를 열어 많은 불교인들과 함께 인간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함께하는 지구라는 가르침을 일깨워 준다.
과거에는 방생에서 물고기나 새 등을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것이 자칫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방생문화도 점차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생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생명이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변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가에 버드나무를 심어 정화작용을 돕거나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산짐승이나 철새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방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생문화는 생명 존중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보다 지금의 현실에 맞게 실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방생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지구를 위한 방생이다. 당장 11월 말의 폭설을 떠올려 보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못할 정도의 기록적인 눈이 내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대란을 일으켰다.
더불어 장마와 태풍은 매년 그 피해와 규모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의 지구가 이제는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던 곳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태어났고, 지구에서 살다가 다시 지구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지구는 단지 우리의 터전을 넘어 모든 생명의 토대이고 그 생명들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생산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며, 흥청망청 자원을 소비한다면 지구가 제공하던 터전은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이제 우리를 품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제 지구를 위한 방생을 해야 한다.
지구를 위한 우리의 방생이 어쩌면 다소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탓을 할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천해야 한다. 그 방법도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으나 오히려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용하는 자원을 조금만 아끼고, 사용한 것은 잘 분리해 버리며,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꼭 다시 쓰면 된다. 그리고 주변에 타인에 의해 버려지거나 훼손된 것을 내가 먼저 줍고 정리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힘이 돼 지구를 살리는 방생이 된다.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한다. 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다.
오늘 무엇 하나를 줍거나 아낀 그 행동이 훗날 더 아름답고 안락한 지구가 돼 우리에게 행복의 터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