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심해 열수분출공 생태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최초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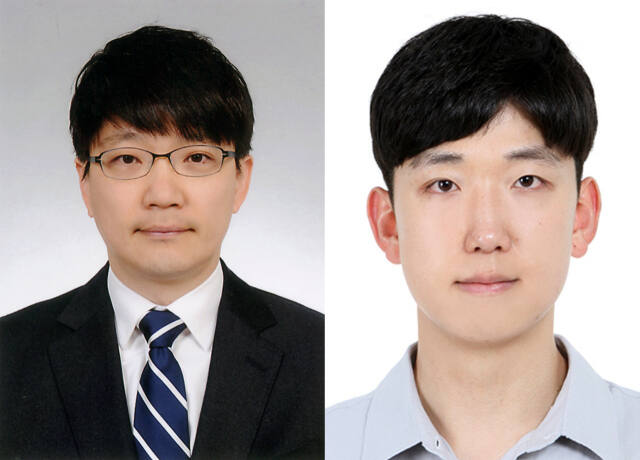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해양동물학연구실 연구진이 최초로 심해 열수분출공(이하 열수공)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확인했다.
19일 인하대에 따르면 심해 열수공은 해저 2천m 이상 깊이의 지각 안에서 마그마로 뜨거워진 물이 분출하는 지역이다.
일반적인 광합성이 아니라 물과 함께 분출되는 황화수소를 이용한 화학 합성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계가 조성됐다.
이 생태계는 다른 생태계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독립 생태계이며, 접근도 어려워 이전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하대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인도양에서 세계 4번째로 발견한 ‘온누리’ 열수공에서 인도양 해저 열수공 저서생태계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조사했다. 다양한 생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분석했다.
연구팀은 특히, 열수공에서 포획한 생물과 환경(해수·퇴적물)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고, 생물 내에서 미세플라스틱 축적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열수공 주변의 저서생태계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먹이가 되는 동물보다 상위 포식자가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의 생물 축적은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논문은 ‘열수분출공 저서 생태계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Microplastic Contamination of a Benthic Ecosystem in a Hydrothermal Vent)’이라는 제목으로 미국화학회(ACS)의 환경 과학 분야 저명 저널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IF: 11.4)'에 등재됐다.
논문은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박병용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전공 박사과정 학생이 1저자로 참여했다.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는 전 지구상에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음을 알려준다”며 “미세플라스틱이 다른 유해 중금속이나 DDT처럼 생물 축적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추가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태계 전반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