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자 급증... ‘확증편향’ 함정에 쉽게 빠져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20·30대, 뉴스매체로 인터넷 포털... 50·60대는 텔레비전 주로 이용 유튜브, 보수든 진보든 한쪽만 보고 싶어 하는 치우친 미디어만 제공 “세대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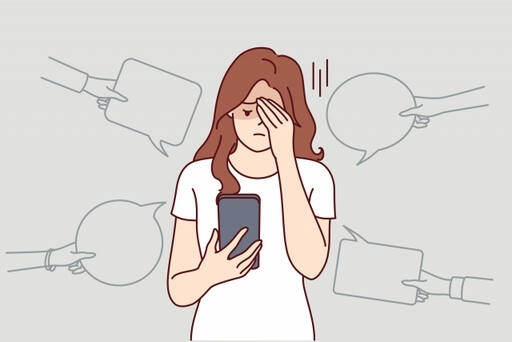
기원전 1700년경 작성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라고 적혀 있다. 기원전 325년경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고 일갈했다. ‘세대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직접 겪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알고리즘이 불러온 확증편향의 문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천명을 조사한 뒤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3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30대와 50·60대가 각각 선호하는 뉴스매체는 달랐다. ‘뉴스나 시사정보를 이용하는 경로를 1개만 선택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텔레비전이라는 답변이 60대 이상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인 반면 20대의 경우 1명도 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엔진’에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20·30대가 62.7%였지만 50·60대 이상에서는 각각 29.9%, 11.3%에 그쳤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유튜브 등 일부 채널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1천254명) 중 98.8%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숏폼 동영상으로 뉴스를 봤다는 사람은 무려 37.8%였다. 이 중 20대 이용률이 62.4%로 가장 높았고 △30대 57.3% △40대 44.0% △50대 30.5% △60대 이상 16.9%였다. 숏폼 뉴스 이용 경험도 20·30대는 각각 20.5%, 22.1%였으나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12.2%, 4.6%에 머물렀다.
유튜브와 ‘쇼츠’를 즐겨 보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런 플랫폼의 영향도 점차 기성언론 못지않게 커졌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알고리즘 기반의 유튜브에선 일종의 ‘확증편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방향으로만 치우친 미디어만 수용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한 방향으로만 보고 싶어 하면 그에게 유튜브는 한쪽으로 치우친 미디어만 제공하는 셈이다.
일방적으로 혐오 표현 등이 담긴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15세 이상 남녀 1천209명에게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94%에 이른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장석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른 세대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이고, 알고리즘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 든 세대를 ‘틀딱’이라고 비하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미디어 교육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폭 넓혀야”
각종 미디어가 조장하는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독자 또는 시청자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선행되고 미디어의 정보를 선별해 내고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평가·분석,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확증편향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웅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시청률, 청취율, 구독률이 나와야 하니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측면이 있다. 대중도 그런 갈등 구도를 흥미롭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교육으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갈등을 언론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미디어교육과 공공기관, 지역별 미디어센터,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미디어기관에서 진행하는 사회미디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미디어센터의 경우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돼 2023년 기준 전국에 58곳이 있고 이 중 경기도에는 11곳, 인천에서 두 곳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교육의 대부분이 영상매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지역미디어센터 2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젊은 세대 이용률이 가장 높은 1인 미디어나 소셜미디어, 유튜브 관련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후 인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미디어 교육 또한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에 걸맞은 규제나 제도적인 노력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인 콘텐츠 생산으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나 영상 노출 빈도를 늘릴 경우 세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이강형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금은 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거나 나이 든 세대들을 올바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가 올바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