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미싱타는 여자들’,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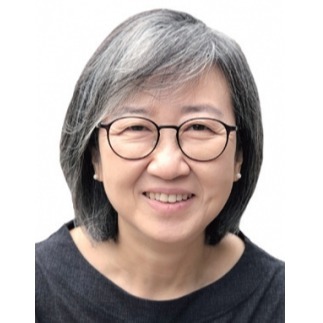
마침 오늘 <미싱타는 여자들>이 개봉한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사망 이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일했던 10대 소녀들이, 이제 5·60대가 되어 4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면 재미없을 거 같다고 찡그리지 마시라, 흐린 회색 같은 비대면에 힘들었던 마음이 온통 생생하게 뭉클해질 테니.
중심이 되는 사건은 1977년 9월 9일, 몇 년 전에 겨우 만들어진 노동학교를 없애려고 하자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벌였던 농성이다. 일상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중년 여성들인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어린 나이에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의 공권력에 대항했을까.
그녀들에게 이 학교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또는 배울 필요 없다고 공장으로 보냈다. 사회는 같은 나이인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겐 할인을, 그녀들에게는 성인과 같은 비용으로 버스를 타게 했다. 성차별 또 다른 차별들에도 무력했을 것이다. 그러다 노동학교에서 한자로 숫자 쓰는 법을 배웠다. 그제야 매일 동전들로 무거운 지갑을 들고 다녔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은행은 입출금을 하려면 무조건 종이에 한자로 숫자를 써넣었어야 했으니까. 이건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장을 나서면 잠을 줄여서라도 학교로 달려갈 만하지 않았을까. 그곳이야말로 일상적인 차별과 소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테니.
이 여성 서사의 가장 큰 보석은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청계천에만 있었을 리 없다. 인천 역시 많은 공장과 공단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어디 공장뿐이랴, 섬들, 포구와 항구들, 식당과 가게들, 교회와 학교들, 이 모든 장소에서 사회와 자연의 어려움에 저항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펼쳐놓지 못한 채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 장소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놓치고, 물리적 공간의 보존과 활용방안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은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작지만 구체적이고도 풍부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인천이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인천의 역사가 시민들의 역사와 연동되게 만드는 노력. 이를 꼭 거쳐야만 그 공간들이 역사를 알고 있는 소수만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절실한 장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문화대학원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