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는 동시] 봄 마중
봄 마중
강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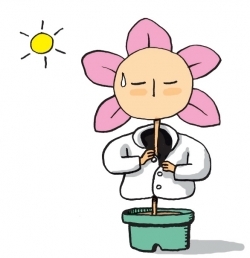
단추 하나 풀면 감기들 것 같고
단추 하나 잠그면 땀이 날 것 같아
단추를 풀었다 잠갔다
변덕스런 봄 마중.
소리 없이 다가온 봄
봄은 소리 없이 온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내지 않는다. 꼭 장난을 좋아하던 우리 셋째 누나 같다. 셋째 누나는 늘 그랬다. 무슨 일이든 소리 없이 다가와서는 깜짝 놀라게 하곤 깔깔 웃었다. 용무는 그 뒤의 일이었다. 누나는 그게 퍽 재미있었나 보다. 이 동시는 소리 없이 온 봄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봄인가, 겨울인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기도 한다.
‘단추 하나 풀면 감기들 것 같고//단추 하나 잠그면 땀이 날 것 같아’. 맞다! 그러다 보니 옷도 어느 것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다. 그럼에도 기분은 왜 이리 좋을까. ‘봄’이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그럴 수밖에. 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들이, 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새싹들이 우리를 마냥 들뜨게 하지 않는가.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는 이제 서서히 몸을 풀리라.
봄의 진정한 의미는 ‘겨울’이란 침묵을 묵묵히 견뎌낸 데 있다. 그 힘씀이 저토록 찬란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추를 풀었다 잠갔다//변덕스런 봄 마중.’ 봄 날씨는 고르지 않다. 장난스럽다 못해 심술궂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재미있지 않은가. 단번에 오는 봄보다는 온 듯 만 듯한 봄이기에 얄밉다가도 사랑스럽지 않은가.
윤수천 아동문학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