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겨울 하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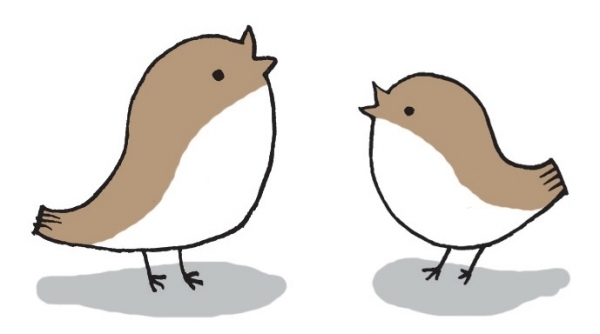
겨울 하나대
- 유하
참새 지저귐만 징허게 시끌맞다
흙빛으로 썩어가는 마람 이엉 학잔집
일곱 딸년 웃음 강그러지던 그 자리도
참새 짹짹이는 소리만 왼종일
징허게 시끌맞다
참새 떼가 어른난 마을
새 울음도 이리 들으니 귀가 질리는 것을
뉘 있어 손이라도 휘휘 저어
저 한껏 방자해진 새떼를 쫓겠는가
꼬부랑 망구 몇 웅크린 집집 벼람박엔
대나무 효자손 하나
손때 절어 덩그러니 반짝인다
*하나대: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작은 부락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문학과지성사, 1991
도시는 소리의 그물이다. 수많은 소리들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사람들의 일상을 잡아챈다. 알람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핸드폰 벨소리, 내비게이션 안내소리, 주문한 커피 찾아가라는 진동벨소리 등등 도시 사람들은 무수한 기계음을 따라 생각 없이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병졸(兵卒)들 같다. 그 많은 소리 중 팔 할은 사실 잡음(雜音)이라 여겨도 무방하다. 필요 없는 소리들이다. 잡음 중에 신경을 찌르고,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기계 소음(騷音)은 근대 도시의 한 특징일 것이다. 소음은 소리의 과잉이고, 의미의 실종이다. 요즘 들어 귀농이나 귀촌이 급증하는 이유는 도시의 삶 자체가 소음에 섞여 이리저리로 시끄럽고 피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고요와 적막과 평안을 찾아 시골로, 자연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도 때론 시끄럽다. 삶이 너무 외롭고 적막하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도 시끄럽게 느껴진다. 유하의 시 ?겨울 하나대?는 나서 키운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꼬부랑 망구 몇 웅크린 집집”의 적막한 풍경을 묘사한다. 한 때 일곱 딸들의 웃음소리로 꽉 찼던 집은 참새 짹짹이는 소리만 가득하다. 이엉도 썩고, 벽도 허물어져 간다. 자식들 커가는 소리가 사라진 낡은 집에서 혼자 듣는 참새소리는 징허게 시끌맞다. 예전 같으면 저 참새들을 휘휘 쫓아줄 자식이나 남편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다. 적막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 종일 들어야만 하는 참새소리에 귀가 질린다. 도시인들에겐 마음에 안식을 주는 자연의 소리겠지만 꼬부랑 망구들에겐 그렇지 않다. 소리란 이렇듯 역설적이다. 웃고, 싸우고, 덜그럭 거리며 함께 밥을 먹는 생기(生氣)의 소리가 있어야 자연의 소리도 듣기 편하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는 불편 소리가 없는 집은 쓸쓸하다. 시인은 그 쓸쓸함을 꼬부랑 망구들의 집 벼람박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손때 절은 ‘대나무 효자손’으로 드러낸다. 그 어떤 사물의 이미지가 늙어감과 외로움과 적막의 지경을 대나무 효자손만큼이나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쓸쓸함이란 곁에 등 긁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리라. 홀로 앉아 가려운 등을 효자손으로 북북 긁는 ‘겨울 하나대’ 마을의 할머니들 모습에서, 나는 불현듯 “지니 음악을 틀어줘.”라고 말하는 TV 속 광고 모델을 떠올려 본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내는 희로애락의 소리가 없는 삶은 차갑고 쓸쓸하다.
신종호 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