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늙은 꽃
아름답게 낭비하는 생의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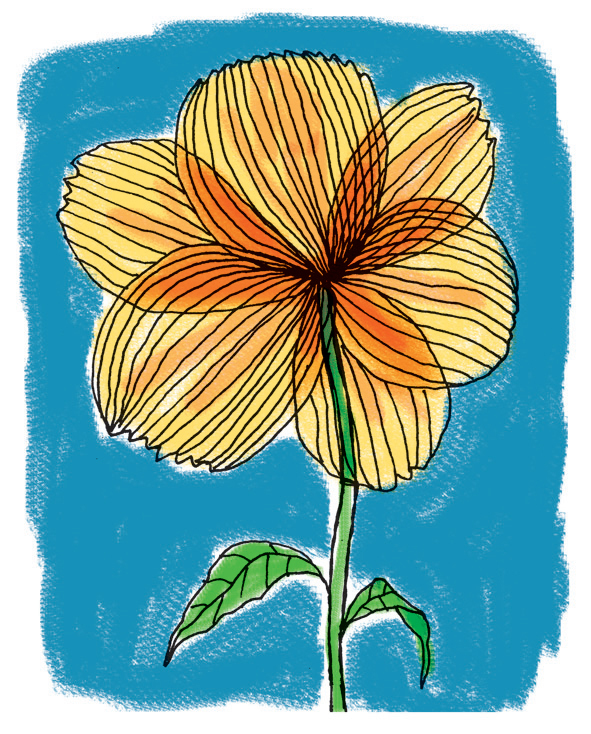
- 문정희
어느 땅에 늙은 꽃이 있으랴
꽃의 생애는 순간이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다 써 버린다.
황홀한 이 규칙을 어긴 꽃은 아직 한 송이도 없다
피 속에 주름과 장수의 유전자가 없는
꽃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오묘하다
분별 대신
향기라니
《다산의 처녀》, 민음사, 2010.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는 “인간은 낭비에 의해 극치에 이른다. 즉 낭비는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영광스런 활동이며 절대 권위의 기호다”라고 말한다. 낭비란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행동을 이르는 말로 대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낭비예찬’을 하는 그의 말은 절약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생산해왔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은 필요 이상의 생산물, 즉 잉여를 창출하게 된 바, 여기에서 인류사의 지독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조르주 바타이유는 잉여를 ‘저주의 몫’이라 명명한다. 모아서 쌓아두려는 소유의 욕망이 전쟁의 본질이며 추(醜)의 근원일 것이다. 잉여를 다 써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영광스런 행동이라는 그의 낯선 주장은 삶의 황홀과 아름다움이 무엇에 있는 지를 생각해보게 만든다.
문정희 시인의 <늙은 꽃>은 삶의 진경(眞境)이 어디에 있는지를 묘파하고 있다. “어느 땅에 늙은 꽃이 있으랴”라는 첫 구절의 이면에는 모든 꽃은 늙지 않는다는 당당한 신념이 자리한다. 아름다움이란 시간에 의해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돌파하는 어떤 힘에 의해 유지된다. 꽃의 생애는 ‘순간’에 집중하는 힘의 발현이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종족의 자존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의 꽃을 피우는 순간은 삶의 절정이고, 존재의 황홀이 느껴지는 떨림의 시간이다. 아름다움은 뭔가를 쌓아두거나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쌓여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사치에 의해 구현되는 자존의 풍경이다.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필 때 다 써 버린다.”는 시인의 진술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황홀의 규칙’이고, 미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 시인의 생각이다. ‘주름’을 걱정하거나 ‘장수의 유전자’를 간직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분별’의 삶은 아름다움과는 동떨어진 삶이다. ‘분별’ 대신 ‘향기’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꽃의 삶은 ‘아름다운 낭비’로 요약된다.
사랑이란 생의 에너지를 아름답게 낭비하는 ‘황홀의 순간’이다.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서 잉여 에너지를 가장 강렬하고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동물”이라는 조르주 바타이유의 도발적 정의를 새롭게 생각해본다. 세상에 ‘늙은 꽃’은 없다. 필 때 다 써버리는 사랑의 꽃들만 있을 뿐.
신종호 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