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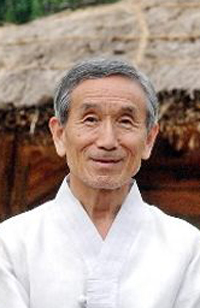
문득 옛 김연수 명창의 단가 사절가가 떠오른다. 꽃 철이 녹음 철로 바뀌는 계절 탓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 뜰 안의 백목련이 하루 이틀 사이에 순백의 자태를 접고 추레하게 지더니, 곧이어 매화와 벚꽃이 푸섶에 흩날리며 가는 봄을 울어옜다. 흩뿌려진 낙화를 보고, ‘간밤의 무심한 비바람에 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졌을고(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 라는 맹호연의 명귀를 음미하기도 전에 천지는 어느새 연초록 물결들로 차일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 김연수 명창이 말년에 애창하던 사절가의 가사와 가락이 여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리 없다.
아름다움과 소소(蕭蕭)로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짓기 일쑤라서 그런지, 춘하추동의 경치를 노래한 사절가 속에는 각 계절의 경승(景勝)도 읊조려 있지만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의 인생무상도 촉촉한 비감으로 농축돼 있다.
며칠 전에는 동심초와 산유화와 이별의 노래 등으로 고난의 시절 국민의 정서를 보듬어주던 작곡가 김성태 선생이 이승을 영별했다. 인걸은 가도 작품은 남는다지만 주옥 같은 작품으로 한 시대를 수놓아 온 다정다감한 작곡가의 빈자리엔 온통 제행무상의 허무와 엽진화락(葉盡花落)의 애상만이 가득한 채 가는 봄에 대한 페이소스를 더해주는 느낌이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을 맺지 못하고, 한갖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계절의 여왕, 찬란한 신록의 5월
소프라노의 미성에 실려 흐르는 당대(唐代) 비운의 여류작가 설도(薛濤)의 이 춘망사(春望詞) 가사는 이 봄따라 유난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어느 시인은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봄철의 낙화를 일러 때를 알고 가는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들의 일상도 가는 봄을 못내 아쉬워만 할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찬란한 5월이 갈마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빠름을 일러 유수와 같다느니, 쏜살 같다느니, 혹은 백마과극(白馬過隙)이니 하며 나부터가 호들갑이기 일쑤다. 하지만 지구가 초당 30㎞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우리네 태양계가 초속 230㎞의 속도로 반지름이 5만 광년이나 된다는 은하계를 치달리고 있는 거대 우주의 속도들을 감안한다면, 기실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지각하며 아쉬워하는 세월의 속도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하찮은 감상들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의 가사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처럼, 꽃피는 봄 4월은 가고 녹음방초(綠陰芳草) 신록의 5월이 되었다.
도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을
잠시 매연과 속진에 찌든 도회생활의 질곡을 벗어나 순수 자연의 품속에 안겨 영혼의 안식을 가져보는 것도 삶의 활력을 위해 요긴한 일이라 하겠다. 때마침 전 우즈베키스탄 최영하 대사가 풍광수려한 영월 고향마을로 이미시 문화서원의 동료 학동(?)들을 초대했다. 청령포 노송들의 솔향과 방랑시인 김삿갓의 음풍농월로 청순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아니 모처럼의 청복이 아니겠는가.
차제에 김삿갓의 싯귀처럼 ‘백화제방의 봄 한 철도 꿈길과 같아 성 밖에 독좌한 백발옹도 가는 세월 탄식하네(繁華一度春如夢 坐嘆城南頭白翁)’라는 시심도 공유해 보고, ‘작은 냇가에서 솥뚜껑을 돌에 얹고 흰 가루 햇기름으로 두견화 전을 붙여(鼎冠撑石小溪邊 白粉靑油煮杜鵑)’라는 만고의 풍류랑(風流郞) 김삿갓이 겪어 본 산 절로 수 절로의 유락(遊樂)이라도 공감해 본다면, 이것만으로도 잠시 별유천지 비인간의 구름 밖 신선이 돼 봄직한 일임에 분명타고 하겠다.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