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재생에너지 전환’ 공론화하고 언론, 정보 전달 넘어 삶의 쟁점 다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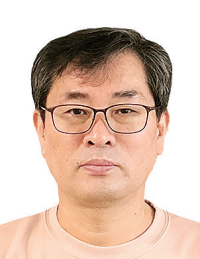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계엄 사태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 막을 내렸다. ‘빛의 광장’의 목소리로 모아 낸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장기간 거꾸로 가고, 헝클어지고, 내던져진 사회개혁 과제가 무논에 갓 모내기한 모가 뿌리 내리듯 소중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위기 상황에서 빛나던 국민 개개인의 담대함과 통찰력, 용기 있는 집단지성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을 더 재촉하기를 응원한다.
대선 기간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는 끝났으나 조기 대선으로 인해 당선인이 국정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 절차는 없고 존속 기간이 짧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오랜 정당 활동의 역사가 있기에 큰 틀에서 국정의 정책 방향과 이행 수단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는 않지만 열린 광장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낸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수용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탁상머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경험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국민 중심의 원칙을 되새기기 바란다.
잘못된 과거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대선 기간 공표한 공약에 얽매이기보다 적어도 임기 초 6개월 이내에 국민 공론화를 통해 명료하고 촘촘하게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묻고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 인류 공동의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공약이 그렇다. 이미 기후대응 선진국에서 검증되고 일반화돼 성과가 분명한 정책과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가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숨쉬는 것이어야 빛을 발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누렸던 ‘플라스틱’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과도한 풍요와 편리함을 취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일 것이다. 소위 ‘딜레마적 물질’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적으로 값싸고, 만들기 쉽고, 가볍고, 편리해 그 쓰임새와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쓰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방출되며, 사용 후 소각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는 물론이고 대기오염 물질이 생성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럼에도 마치 공기와 물처럼 당연시된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젠 정책의 실패를 경험하기에는 한정된 재원, 한정된 토지,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의 모임인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기후위기 대응 기후저널리즘’ 활동이라는 의미 있는 공동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언론이 단순한 기상이변이나 재난 차원의 문제로 다루는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사고의 전환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쟁점을 다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다. 작은 변화가 큰 파도를 만들어낸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위기와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 중 하나로 “목소리를 내라”고 권고한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