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은 벼락처럼 온다
-백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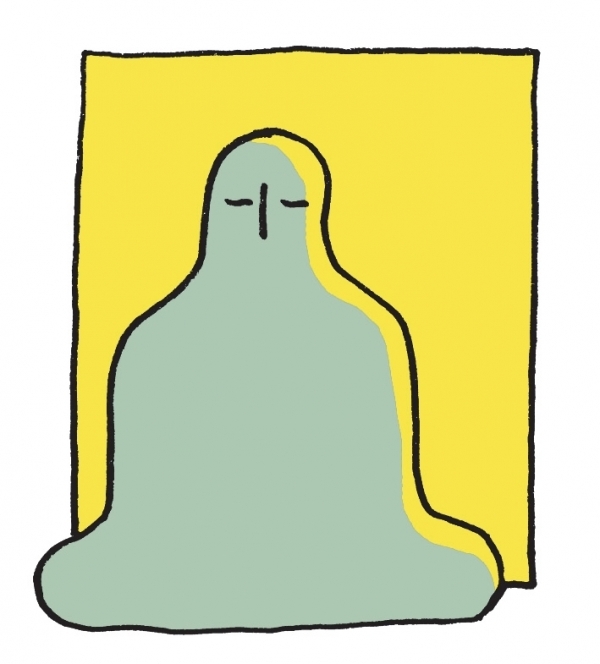
담장 밖에서
밖으로만 그림자를 늘이는 나무는 안다.
몇 차례 돌팔매쯤 거뜬히 견디는
키 작은 관목조차 알고 있다.
시간은 철갑(鐵甲)을 둘러주거나 석회질 외투로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님을.
밀어내는 힘과
억누르는 세상이 만났을 때
축축하고 질긴 외피로 자기 한계를 그을 때
금은 이내 상처가 되고
상처는 강이 되어
모든 뜻밖의 저녁 아래로 흐를 뿐이란 걸
시작은 언제나 벼락처럼 온다.
《북극권의 어두운 밤》, 시인동네, 2020.
세계는 내 의지(意志)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이 지구 상에 사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다.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려도 똑같은 모습의 장미꽃이 없듯이 이 세계는 각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 그런 불가피의 사정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객관에 지나지 않으며, 직관하는 자의 직관, 한마디로 말하면 표상인 것이다.”라는 말로 요약했다. 한마디로 세계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의지에 비친 바깥의 모습이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다. 그 생각을 확장해보면 삶이란 ‘나’라는 ‘안’(內)의 영역과 세계라는 ‘바깥’(外)의 영역이 맞부딪히는 어떤 전투 같은 것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백인덕 시인은 시 <시작은 벼락처럼 온단>에서 그 전투를 “밀어내는 힘과/억누르는 세상이 만났을 때”로 표현한다. 밀어냄과 억누름의 전투는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은 대체로 의지를 강한 것에 결부시킨다. ‘불굴의 의지’라는 관용적 표현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솔직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위적일 경우가 많다. 세계의 억누름은 의지의 밀어냄보다 강하다. 삶의 동력은 성공의 의지가 아니라 실패의 자각에 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녕 아프다. “축축하고 질긴 외피로 자기 한계”를 그을 때 생긴 ‘금’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강이 되어 “모든 뜻밖의 저녁 아래”로 흐르는 일련의 과정을 진술하는 시인의 솔직한 내면은 허탈하고 힘겨워 보인다. 그렇지만 허탈보다 어떤 약동이 앞선다. ‘뜻밖의’라는 표현은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무방비의 순간으로 읽히기보다는 새로운 시간의 진동으로 다시 읽힌다. “시작은 언제나 벼락처럼 온다.”는 강렬하고 빛나는 구절 때문에 그러하다.
아파하는 자만이 회복의 기미를 읽을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성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가장 깊게 침몰할 때 비로소 바닥을 치고 오를 수 있다. 벼락처럼 찾아오는 ‘시작’을 사유하는 시인에게서 나는 “몇 차례 돌팔매쯤 거뜬히 견디는/키 작은 관목”의 시간을 떠올려 본다.
신종호 시인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