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거처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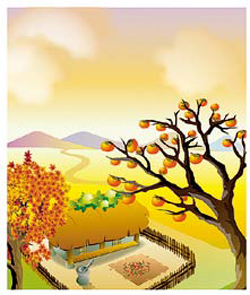
- 정병근
땡볕 속을 천 리쯤 걸어가면
돋보기 초점 같은 마당이 나오고
그 마당을 백 년쯤 걸어가야 당도하는 집
붉은 부적이 문설주에 붙어 있는 집
남자들이 우물가에서 낫을 벼리고
여자들이 불을 때고 밥을 짓는 동안
살구나무 밑 평상엔 햇빛의 송사리떼
뒷간 똥통 속으로 감꽃이 툭툭 떨어졌다
바지랑대 높이 흰 빨래들 펄럭이고
담 밑에 채송화 맨드라미 함부로 자라
골목길 들어서면 쉽사리 허기가 찾아오는 집
젊은 삼촌들이 병풍처럼 둘러앉아 식사하는 집
지금부터 가면 백 년도 더 걸리는 집
내 걸음으로는 다시 못 가는,
갈 수 없는, 가고 싶은
≪번개를 치다≫, 문학과지성사, 2005.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다. 식구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집의 표정은 밥 짓는 냄새로 시작해 밥 먹는 소리로 아늑해지고 깊어진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남자들의 고달픈 시간과 불을 피우고 쌀을 씻는 여자들의 따뜻한 시간이 만나 생명을 길러내는 집의 역사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희로애락의 숨결로 한층 단단해진다. 집은 사람들에게 ‘식구’라는 연대감(連帶感)과 ‘고향’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여 ‘집 밖’의 거친 시간에 맞서게 한다. 하여, 집은 몸의 안식처가 되고 영혼이 성숙되는 신화의 장소가 된다.
정병근 시인의 <머나먼 옛집>은 삶의 거처를 상실하고 부유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쓸쓸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사정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집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현상이다. 집이 주택과 동일해졌다. 다시 말해서 집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집이 우리의 손아귀에서 금전적 가치로 쉽게 측정되고 표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말로 유추해볼 수 있다. 집의 근원적 의미가 ‘가격’으로 측정되는 물신적 세태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내면을 소외시키고 왜곡한다. <머나먼 옛집>은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집’의 본래적 의미를 토속적 이미지와 신화적 서사로 탐색한다.
‘땡볕’을 ‘천 리쯤’ 걸어야 비로소 ‘마당’이 나오고, 그 마당에서 다시 “백 년쯤 걸어가야 당도하는 집”의 출현은 사뭇 신화적이다. ‘붉은 부적’이 ‘문설주’에 붙어 있는 집에는 ‘낫’을 벼리는 남자와 ‘불’을 때고 ‘밥’을 짓는 여자가 있다. ‘흰 빨래’가 바람에 날리고, ‘감꽃’이 ‘뒷간 똥통’에 떨어지고, ‘채송화’와 ‘맨드라미’가 ‘함부로’ 자라는 곳에서 ‘젊은 삼촌들’이 ‘병풍’처럼 모여 식사를 하는 풍경은 친근하고 낯설다. 불현듯 그 ‘옛집’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일게 하지만 그곳은 “내 걸음으로는 다시 못 가는” 불귀(不歸)의 장소이자 상실의 장소다. “갈 수 없는, 가고 싶은”이라는 속수무책의 좌절과 염원만 애틋할 뿐이다. 삶의 온기가 없는 거처는 집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혼의 거처를 상실한 ‘홈리스’(homeless)일지도 모른다.
신종호 시인
댓글(0)
댓글운영규칙
최신순
추천순













